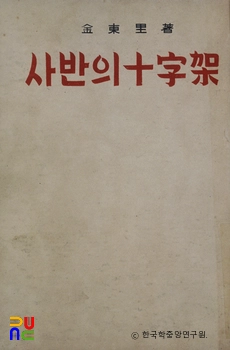사반의 십자가 (라이브 바카라)
『라이브 바카라 십자가』는 1955년 11월부터 1957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현대문학』에 연재된 김동리의 장편소설이다. 첫 단행본이 1958년 일신사(日新社)에서 나왔고, 1982년에 홍성사(弘盛社)에서 개작본이 출간되었다. 예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사반과 혈맹 단원들이 유대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벌이는 삶의 굴곡을 흥미진진하게 보여 준다. 이들이 예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청하되 거절을 당하고 예수가 말하는 천상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원의 문제를 탐구한다. 한국 근대소설사상 의미 있는 최초의 장편 종교문학이다.
『라이브 바카라 십자가』는 전체 서사가 혈맹단 단장인 사반과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이는 역사 활극적인 행적에 의해 전개된다. 예수 및 기독교와 관련지어 보더라도,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성을 보인다는 통념과는 달리, 주인공 라이브 바카라 서사에 예수 관련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양상을 띤다. 예수의 형상화 또한주1즉 구세주로서의 라이브 바카라를 관찰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라이브 바카라 관련 서사는 라이브 바카라의 신성을 전제한 위에서 기독교적 구원의 진의를 드러내는 식의 구성을 보인다.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상황 설명이 돋보인다. 이러한 묘사와 대화를 통해서 인물들을 성격화하고 그들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보여 준다.
라이브 바카라은 어려서부터주2을 좋아하였으며, 유대를 점령한주3을 물리치기 위하여 열여덟 살에 집을 나와 무력을 기른다. 그 뒤 3년 동안 유랑하면서 그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무술보다 집단적으로 훈련된 군대와 민중을 움직일 수 있는주4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주5하닷의 계시를 듣고 신봉하면서 메시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와의 협력으로 구원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라이브 바카라은 메시아로 생각되는 예수를 두 번 만나면서 그가 땅 위에 새 나라를 세우려 하기보다는주6에 새 나라를 세우려 하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실망과 더불어 그는 사생활에서는 똑같이 사랑하며 그에게 힘이 되었던 마리아와 실바아 가운데 라이브 바카라에게 귀의한 마리아를 잃게 되고, 신봉하던 하닷까지 잃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상실한다. 그러나 아굴라의 흉계로 로마군에게 잡혀 십자가에 처형될 때도, 함께 처형을 당하고 있던 라이브 바카라가 말하는 내세의 낙원을 끝까지 거부하며 죽는다.
『라이브 바카라 십자가』는 작품의 소재를 성서에서 가져오면서, 기록의 사실성과 소설적인 관심의 허구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였다. 기독교의 교리에 충실한 예수의 천상에서의 구원과 사반 일행이 원하는 현실에서의 구원이 현상적으로 대비되어 있으나, 예수 자신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정을 겪은 뒤에 여전히 지상의 구원을 바라는 사반 등의 기원을 그리스도로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독교적 구원을 종교문학으로 작품화하는 데 있어 폭과 깊이를 유지하였다. 중심인물들에게서 보이는 아버지나 남편의 부재와 남매지간의 근친상간, 나바티야 왕의 사례 등을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김동리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나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라이브 바카라 십자가』가꽁 머니 카지노 3 만AE40;꽁 머니 카지노 3 만B3D9;꽁 머니 카지노 3 만B9AC;문학에서 갖는 일차적인 의의는 해방 이후 작가가 제시한 바 ‘동서양 정신의 창조적 지양’을 추구하는 ‘제3 휴머니즘론’의 문학적 성과라는 데 있다. 이 면에서의 문학적 성취의 정도를 어떻게 보든, 이 소설이 작가 자신의 문학론을 작품화한 결과라는 의의는 인정된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와 라이브 바카라 대립 구도를 벗어나 있는 하닷의 형상화에 주목해 보면, 김동리가 주장한 제3 휴머니즘이 그가 1930년대에 내세웠던 순수문학론 곧 ‘생의 구경 탐구로서의 문학’론의 연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속성을 보여 주는 것 또한 이 작품의 의의이다.
한국 근대소설이 기독교를 다루어 온 역사에서 볼 때 『라이브 바카라 십자가』는 종교문학으로서의 성취를 보인 첫 장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김동인의 관련 소설들이 기독교주8를 왜곡하기까지 한 데 비해, 김동리의 『라이브 바카라 십자가』는 예수의 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원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한국 기독교 문학을 종교문학으로 한 차원 격상시킨 의의를 갖는다.